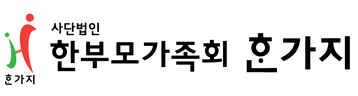필자 하루의 ‘하루수다’는 일상생활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하루의 수다를 푸는 형식으로 올리는 글입니다. 특히 하루는 일본어로 ‘봄’이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필자 하루와 함께 일상생활의 수다를 풀어볼까 합니다. (편집자의 주)
 |
| 출처=하루 |
어렸을 때 소풍 가는 날은 최고로 신나는 일이었다. 학교를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건 곧 숙제를 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 그보다 더 들뜨게 한 건 일 년에 딱 한 번, 엄마의 김밥을 맛볼 수 있어서다.
소풍의 백미는 모름지기 김밥이 아니겠는가?
살림살이가 녹록치 않은 농촌 집안인지라 김밥은 꽤나 사치스런 음식 중에 하나였다. 재료도 변변치 않아 시금치, 달걀, 단무지, 당근에 당시로서는 꽤 비싼 햄이나 소시지가 밥 알 사이에 자리를 잡고 김에 똘똘 말려 있는, 말 그대로 평범한 김밥이었다. 그런데 아직 그 김밥 맛을 잊을 수가 없다. 세상을 살면서 아직 한번도 그때의 맛을 뛰어넘는 김밥은 없었다. 고소하고 향긋한 참기름 냄새와 알알이 박힌 참깨가 풍미를 더 하긴 해도 뭐가 막 대단한 음식은 아니었는데. 그런데도 그 때 그 김밥의 맛은 어디에도 없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써도 안된다. 큰 맘 먹고 가장 신선한 재료를 사서 정성껏 김밥을 말아도 그 맛이 안난다. 유명한 가게의 김밥을 다 주워 먹어도 분명 맛은 있는데 그 맛이 아니다. 뭔가 가장 중요한 재료 하나가 빠져 있는 느낌이었다. 어렴풋한 기억으로만 존재하는 옛날 김밥 맛이지만 잊을 수 없는 뭔가가 분명 있었는데. 어째서 그 맛이 안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옛날 그 김밥 맛이 온전히 떠오르는 것도 아니었다. 그걸 뭐라 불러야 할까? 추억이라고 해야할까? 아니면 엄마의 손맛이라고 해야할까? 독특하게 미각을 자극했던 감칠맛은 더이상 찾을 수가 없게 됐다.
라면도 비슷하다. 고등학교 때 자율학습 들어가기 전 매점에 가서 후다닥 해치웠던 천 원짜리 라면의 맛을 아직 잊지 못한다. 물과 면, 스프만 넣고 끓인 라면인데, 그 흔한 달걀도 풀어 넣지 않았는데 지금껏 어떤 라면을 먹어도 그 맛이 나지 않았다. 소고기 국물 맛의 라면 국물을 한 번에 들이킬 때의 짜릿함을 잊을 수 없다. 시판되고 있는 라면 중에 그 맛을 내는 라면은 없었다. 분명 그때보다 식재료도 좋아지고 기술도 나아졌을텐데 내 입맛이 변한건지 어떤건지 그냥 자극적인 맛만 느껴졌다.
도대체 왜 그럴까? 그 때의 환경과 감정이 지금과 달라서일까? 모 라면회사에서 클래식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옛날 라면 맛을 흉내 낸 적이 있었지만 거기까지였다.
세월이 흐르고 오십 줄을 넘긴 내게 그때 김밥과 라면 맛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식당은 없다. 엄마도 더 이상 김밥을 말지 않는다. 백 년 천 년을 연구해도 그 맛을 재현할 수는 없을거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거나 감정의 상태를 되돌리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일이다. 그 맛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니 문득 슬퍼졌다. 그렇지만 지금 내가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기억 속에 차곡차곡 쌓는게 삶을 대하는 자세라 생각했다.
과거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저 곱씹고 추억할 뿐이다. 물리학자들은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시간은 그저 인간이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낸 숫자에 불과할 뿐 단 1초의 시간도 찰나에 이르면 연기처럼 사라질 뿐이다. 난 오늘도 엄마표 김밥의 맛을 찾아 김밥 재료를 담는다. 이번 주말엔 좀 더 정성을 들여 김밥을 말아 볼 요량이다. 그때 그 김밥 맛의 백분의 일이라도 따라 잡을 수 있다면 난 행복할 거 같다. 입 안에 가득 김밥을 넣고 오물오물 시간을 씹어 보련다. 그래, 내게도 맛난 추억이 있었구나. 그저 감사할 뿐이다.
[저작권자ⓒ 해브투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