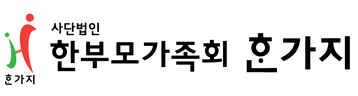필자 하루의 ‘하루수다’는 일상생활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하루의 수다를 푸는 형식으로 올리는 글입니다. 특히 하루는 일본어로 ‘봄’이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필자 하루와 함께 일상생활의 수다를 풀어볼까 합니다. (편집자의 주)
 |
| 출처=해브투뉴스 |
한국인에게 밥은 어떤 의미일까? 흔히 ‘밥심’이라는 표현을 쓴다. 국어사전에 밥심의 정의는 이렇다. “밥을 먹고 나서 생긴 힘”. 탄수화물이 풍부한 밥 한 끼는 열량을 채우는데 탁월한 음식이다. 그래서 우리는 ‘밥심으로 산다’고 한다. 먹기 위해 살고, 먹기 위해 일한다. 여든 여덟 번 농부의 손길이 닿아야 쌀 한 톨이 나온다니 농부 입장에선 밥 한 술은 그냥 단순한 음식이 아닐 것이다. 쌀이 귀하던 시절, 아침 인사로 “식사하셨어요?”는 배고픔에 대한 살가운 안부였으리라.
나의 아버지는 농사꾼이었다. 땅주(땅주인)에게 땅을 빌려 소작농으로 벼를 키웠다. 열 마지기가 조금 넘는 논에서 아버지는 하루 종일 일을 했다. 밤이고 낮이고 하루도 쉬지 않고 논을 살폈다. 물길을 내고, 논두렁을 트고, 피(잡초)를 뽑고, 약을 쳤다. 노란 벼들이 일제히 바람에 흔들리며 고개를 숙일 때까지 아버지는 논에서 살다시피 했다.
그렇게 추수한 벼를 탈곡해 도정을 하면 뽀얀 빛깔의 쌀이 얼굴을 내밀었다. 반반한 그놈을 포대에 담아 땅주에게 반을 주고, 나머지 반은 살림에 보탰다. 머리가 굵지 않았던 나는 밥 한 끼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다. 습관처럼 밥풀 몇 알을 그릇에 남긴 채 수저를 놓으면 아버지는 불호령을 내렸다.
밥알 몇 개가 무슨 대수라고, 혼자 씩씩대며 남은 밥알을 입 안에 우겨 넣었다. 밥풀떼기에 담긴 아버지의 진심을 나는 몰랐다. 그때부터였을까? 오십줄을 넘긴 지금까지 밥공기에 밥알 한 개 남기는 버릇이 없다. 아버지의 엄한 가르침을 곱씹어 밥알을 꼭꼭 씹는다.
식습관이 바뀌면서 쌀 소비가 많이 줄었다고 한다. 1인당 쌀 소비량이 50kg에도 미치지 못한다. 쌀 소비량은 38년 연소 감소해 30년 전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단다. 집에서 밥을 해먹는 인구가 줄어들고, 다양한 음식을 배달시켜 먹거나 외식을 많이 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서다. 빠르고 편한 간편식단도 한 몫 하고 있다. 거창하게 쌀 소비를 늘리자는 얘기가 아니다. 밥 한 끼가 갖는 따뜻한 온기와 진심을 느껴보자는 거다.
최근 모 OTT에서 방영을 끝낸 드라마 한 편이 있다. “오늘은 좀 매울지도 몰라”가 그것이다. 강창래의 에세이가 원작이다. 말기 암을 앓고 있는 아내를 위해 요리에 서툰 남편이 부엌에서 이런 저런 음식을 만든다는 내용이다. 별거 중인 남편은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가장 진솔하게 밥을 짓고 음식을 내놓는다. 잡채를 볶고 돔배국수와 보리굴비를 만든다.
몸에 좋다는 재료로 몇 시간 동안 한 자리에서 야채죽을 끓이기도 한다. 남편이 건네는 밥 한 끼는 아내에 대한 연민이 아니라 작은 응원이었을 것이다. 소박한 격려였을 것이다.
3화 에피소드가 특히 인상 깊었다. 굴비를 내놓는 이야기인데 남편은 태어나서 굴비 요리를 해 본 적이 없다. 인터넷을 뒤져 레시피를 살펴도 도통 엄두가 나지 않는다. 아내에게 도움을 청하니 아내가 말한다. “그냥 그대로 쪄서 프라이팬에 살짝 튀기면 돼” 이렇게 쉬운 방법이라니 남편은 웃는다. 그러면서 아들과 아내에게 굴비가 왜 굴비인지를 설명한다. “굴비는 뜻을 굽히지 않는다는 뜻이야. 굴비가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가봐. 굴비에는 좋은 단백질과 비타민A와 D가 풍부하고 지방이 적어 소화도 잘 된대. 몸이 약한 사람에게 무척 좋다니까.”
굴비는 한자로 굽을 굴(屈)에 아닐 비(非)로 쓴다. 직역하면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다. 개똥철학처럼 들리겠지만, 계묘년 새해엔 따뜻한 밥 한 끼의 힘으로 ‘굴비’하기를 소망한다. 아 그런데, 정말이지 밥 한 숟에 굴비 한 점은 반칙 아닌가?
[저작권자ⓒ 해브투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